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마음 속 멍에가 될 불명예를 지니고 싶지 않았던 영태가 어떤 숙고를 거듭하는 시간. 그래서 걸음을 되돌리는 순간. 그 애달픈 고독은 끝내 존엄이나 숭고와는 거리가 멀겠지만, 적어도 무언가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을 환기한다. 나빠지지 않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자 상태라면."
[ACT! 130호 리뷰 2022.06.11]
나빠지지 않기 -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리뷰
이보라(영화평론가)
박송열 감독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는 무직인 두 부부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다. 남편 영태는 선배에게 카메라를 빌려줬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아내 정희는 부족한 가계에 사채를 빌려 썼다 난감해지는 상황이 주요한 가닥을 형성하는 이 서사에는 해소의 측면으로서의 결말이 없다. 영화는 구직활동을 하며 삶의 더 나은 방향을 꾀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의깊게 응시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가져다줄 결과물을 판단하진 않는다. 쉽게 말해 이들의 가난은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영화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쓸쓸하지만 독려하고픈 어떤 결심 이후에도 부부의 가난이 지속될 것임을 자연스럽게 안다.
그렇다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는 대체 무엇을 다루고 있는 걸까. 일단 본편에서 묘사되는 가난은 매우 일상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은 ‘일상’이란 표현이다. 일상이란 사실상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천차만별의 뜻을 지닌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의 가난이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만하다는 의미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부부가 겪는 빈곤이 ‘완벽한’ 빈곤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난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의 신세, 그리하여 삶의 생기를 모두 잃은 상태로 간주하던 여느 ‘리얼리즘’ 영화들과 달리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는 적극적인 가난의 현장을 떠올리기보다 만연한 가난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기로 작정한다. 그리하여 영화는 극단적인 묘사가 리얼리티와 동의어가 되곤 하는 부당한 해석을 거부한다. 물리적 폭력이나 질병 등의 국면 없이도, 오열이나 분노 등의 감정 없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수 있다. <소공녀>의 미소가 위스키와 담배를 즐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집을 나와 떠돌고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찬실이가 갑작스럽게 실직한 후 제 손으로 일해 버는 돈을 당당히 여겼다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의 부부는 그 중간 어딘가쯤에서 이따금 스무디와 회도 먹는 ‘사치’를 부리면서도 오로지 단순한 삶의 유지를 위해 수치를 견뎌가며 노동한다.

말하자면 전셋값이 오를까 염려하고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하는 영태와 정희에게 가난은 침투되거나 전염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상태(state)이다. 그래서 부부는 일상을 적극 쇄신하거나 뜯어고치는 일에 딱히 주력하지 않는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생계를 잇는 것이다. 지금이 그나마 존속하게끔 더 악화되지 않는 것.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의 가난은 가로막힌 세대에게 미스터리적 여정을 촉발하는 억압의 기제나(<버닝>), 대물림되는 가난의 형국을 타자의 위치에서 응시하는 극적 행위(<기생충>)가 아니며 이들처럼 정교하고도 ‘서사적인’ 세계 또한 아니다. 혹은 휴가마저 노동의 굴레 안에서 반복된다는 씁쓰레한 현실을 비추는 <휴가> 속 비정한 세계도 아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는 제목 그대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날씨를 집 베란다나 담벼락 앞에 서서 바라보고 감각하듯, 기후에 맞게 옷을 입고 우산을 준비하듯 그저 주어진 조건에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에게 할당된 삶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유의할 것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에서 제시되는 어떤 교환의 법칙이다. 이는 영태의 카메라를 빌린 선배가 영태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든지, 수중에 돈이 모두 떨어지자 집에 있던 중국 지폐를 환전하는 것까지, 무언가 서로 주고받거나 이것을 저것으로 바꾸는 행위가 영화에서 반복된다. 내내 미동도 없이 고정된 카메라와 전체적으로 기복 없는 톤 때문에 잔잔하게 보이지만 실상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는 인물과 인물이 대화와 표정과 기분을 주고받는 방식도 여러 차례 선보인다. 생계의 회복이나 전환을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들마다 부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새삼스러운 악수를, 비장한 눈인사를 숏-리버스숏으로 주고받는다. 내가 원해 스무디를 샀듯이 이번에는 당신이 먹고 싶은 회를 먹자는 배려의 언어도 이러한 법칙에 의거한 것이며 이로 인해 두 인물의 삶이란 불화든 친교든 상대방이 존재해야 가능한 방식임을, 무언가를 ‘같이’ 함으로써 이들이 동시에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가 부부의 이야기임을 고려해보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부득불 현실의 기준을 적용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한 명씩 결합되어 이룬 이 소집단은 연인 관계보다 더 적극적인 승인을 얻는 관계로 대개 기쁜 일이건 궂은 일이건 모두 함께 겪는 운명공동체로 여겨진다. 부부의 등장은 자주 갈등 상황을 예견하기 마련이고, 지독하게 사랑하거나 서로를 굳건히 신뢰하는 부부는 잘 없다. 그러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의 부부는 좋지 않은 여건에 놓여도 심각하게 싸우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온화한 사이도 아니며 성애적인 관계는 더더욱 아니지만, 첫 장면에서 둘이서 고기를 구워먹는 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듯 이들에게 ‘함께’라는 감각은 꽤나 명시적이다. 그러나 내내 함께하던 이들이 어떤 무기력한 감각과 함께 점차 분리되어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언가를 함께 먹는(있는) 장면은 와해된다. 영태의 카메라를 빌려간 선배가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영태가 대리운전을 하고, 사채 빚을 갚지 못해 난처해진 정희가 배달을 하며 불안정한 노동에 가담함으로써 각자의 사이클이 달라진 이들은 따로 끼니를 때운다. 혹은 전날 밤 함께 마신 술이 한 사람에게는 나른한 늦잠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숙취의 구토로 발산되듯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데로 나아간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는 이 부부의 낮과 밤이라는 일상을 이루는 시간대가 서로 교합하지 않으면서 ‘함께’의 문제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바라본다.
종국에 우리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의 결말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음 속 멍에가 될 불명예를 지니고 싶지 않았던 영태가 어떤 숙고를 거듭하는 시간. 그래서 걸음을 되돌리는 순간. 그 애달픈 고독은 끝내 존엄이나 숭고와는 거리가 멀겠지만, 적어도 무언가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을 환기한다. 나빠지지 않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자 상태라면. □
글쓴이. 이보라(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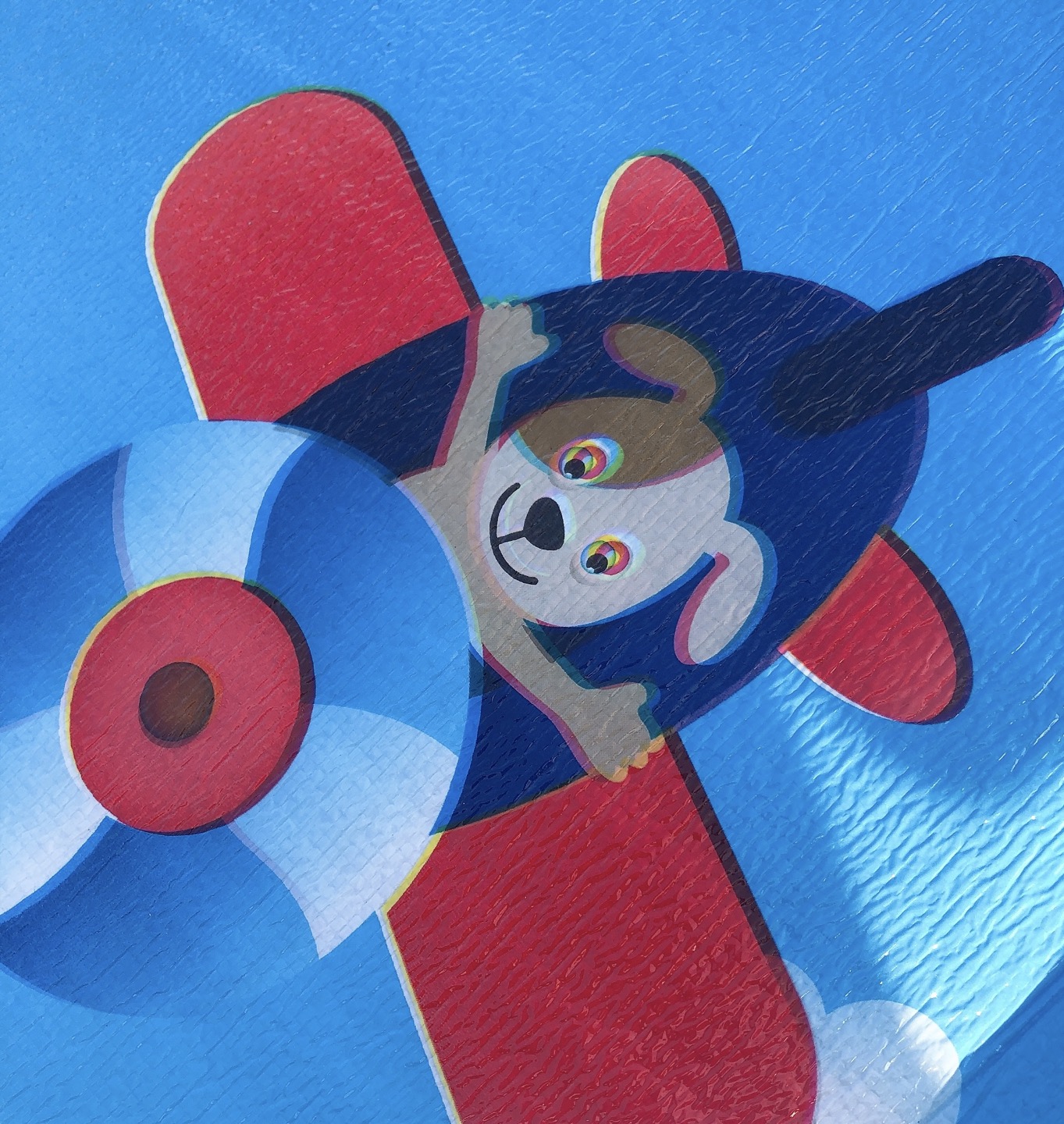
부산영화평론가협회와 씨네21을 통해 영화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전체 기사보기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말 없이 말하는 얼굴들 - 영화 <군다> (0) | 2022.07.07 |
|---|---|
| 공동-동시 돌봄으로서의 비평 - 책 <뭔가 배 속에서 부글거리는 기분> (0) | 2022.07.07 |
| 연대의 장소를 찾아서 - <세월> 리뷰 (0) | 2022.06.07 |
| 다큐 창작자가 쓰는 다큐 리뷰- 이 불안마저 마주할 때 - 다큐멘터리 <개청춘> 리뷰 (장민경 감독) (0) | 2022.06.07 |
| 이 얼굴들을 보라 - <미싱타는 여자들> 리뷰 (0) | 2022.04.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