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40호 / 2007년 4월 9일
|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
||||
| 나비 (들소리 활동가) |
||||
| [편집자 주] 2007년 3월 25일, 대추리 마지막 촛불 행사. 주민들과 지킴이들, 그리고 지난 시기 대추리와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추리 농협 창고에 모여 900일이 넘는 촛불행사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주민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은 황새울 방송국 ‘들소리’의 영상이 상영되었다. 이렇게 지난 열 달 동안 꾸준히 대추리 주민들의 삶과 투쟁의 모습을 담아내 온 들소리 방송국은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시는 시점까지 방송을 계속하고, 이후에는 그동안의 촬영 내용과 이주 이후의 모습을 담아서 마무리 작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 이상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활동 전망을 묻는 것은, 지금 정신없고 먹먹한 대추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대신 이주가 확정된 이후에도 카메라를 놓지 않고 방송을 계속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는 들소리 활동가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했다. 2006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대추리라는 삶/문화/투쟁의 공동체에서 미디어를 통해 함께해온 들소리 방송국. 이 활동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할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함께 안타까워할지, 모두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번 ACT!에 기고했던 글에서 방송국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주저리주저리 썼던 기억이 난다. 다시 글을 쓰라고 한다. 이번 글은 저번에 썼던 글과는 비교가 안 되게 쓰기 어렵다. 솔직히 ‘대체 뭘 쓰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다. 이런 내 질문에 돌아온 답은 ‘방송국을 정리하면서 드는 소회’를 쓰라는 거다. 아... 정말 너무나 어렵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라고 하다니 너무 한다 정말. 방송이 200회를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주 6회 방송에서 주 3회 방송으로 방송 횟수도 줄었고, 방송국 기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200회 방송이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이다. 지난 아홉 달 동안 <들소리>의 기자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끝이다.
방금 전 같이 일하는 폴에게 ‘우리가 테입 몇 개 분량을 촬영한 거지?’라고 물었더니 어이없다는 말투로 ‘니가 세어 봐’라는 답이 돌아온다. 뭐 우리야 항상 이런 식이다. 자, 한번 세어볼까... 매일 60분짜리 테입을 1-2개 정도 촬영했다고 보면.... 뭐 답이 안 나오긴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많다. -_-;;; 촬영분량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상들이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순간들이 그 영상들 안에 들어 있다. 지난 해 여름 방송국을 처음 개국할 때만 해도 우리들은 모두 영상은커녕 카메라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도 난감해했던 사람들이 아니던가.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웃음이 많은 나 같은 경우 너무 웃겨서 촬영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곤 하는 일이 많았었다. 그것 때문에 욕도 참 많이 들었다. 그리고 서로 촬영하다가 울었다고 놀리는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시골에서 살다보니 같은 대화가 반복이 되는지도 모르고 늘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늘 똑같다. 늘 같은 것에 웃고, 같은 이유 때문에 눈물이 난다. 주민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이웃들은 때때로 아파하고, 때때로 기쁘다. 그 사람들은 왜 아프고 왜 기쁠까? 그건 너무 뻔하다. 여기에 구구절절 쓰지 않아도 글을 읽는 이들은 다 알거라고 짐작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프고 기쁜 그 순간에 우리도 덩달아 함께 아프고, 함께 기쁘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더 이상 카메라를 잡고 있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건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별것도 아닌 일이 이 분들의 고통을 한 점이라도 약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때에 우리는-나는 어떻게 했던가? 때로는 그냥 카메라를 억지로 들고 있기도 했을 테고, 더 이상 찍지 못하겠다며 카메라를 내려 버린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들에 늘 카메라를 버리지 않았던 들소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카메라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말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지난 5월 4일의 행정대집행을 이후로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싸움은 어찌 보면 정점에서 서서히 떨어지는 형상을 하고 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5월 4일 행정대집행 이후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사실 지금도 완전히 괜찮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5월 4일이 지나고 겨우 진정이 될 무렵, 정부는 공가철거라는 명분으로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 다시 쳐들어왔다. 용역들이 들소리 배추밭을 밟아 버리고, 지킴이들이 살던 집을 부수고, 들소리 대문 앞까지 쳐들어왔다. 그 때 처음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 집은 나에게 그냥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공간이었을 뿐 그 집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가꾸고, 살아 온 이 집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집이었던 것이다. 나에게 고향이 있었던가? 물론 내가 태어난 곳이 있긴 하지만 난 한 번도 그 곳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곳을 나의 고향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늘 이곳은 나에게 고향일 것이다.얼마 전 주민들의 이주합의가 발표되었다. 주민들이 이주를 결정했다는 기자회견이 있던 날 우리는 그 소식을 신문을 통해 알았다. 주민들은 이곳에 사는 지킴이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 사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일은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마치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당황스러웠고 정신을 좀처럼 차릴 수 없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심정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주민들을 이해했다. 지금은 모두에게 좋은 끝이 되길 바랄 뿐이다. 그렇지만 좋은 끝을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일은 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다만 간절히 바랄 뿐이다. ‘더 이상의 고통은 없기를, 이 분들의 삶이 이제는 편안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나는 빌고 빌었다. 내 소원을 이루어질까? 모르겠다. 그냥 똑같이 또 한 번 빌 뿐이다. ‘모든 게 다 평안해졌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 대보름이었다. 대추리에서 보내는 마지막 대보름, 바로 그것이다. 풍물패가 대추리 마을을 집집마다 돌면서 지신밟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들소리 방송국에 풍물패가 마지막으로 들렀다. 집주인이 한마디 하라며 사람들이 거든다. 엉겁결에 앞에 나가 ‘들소리 집주인’으로 한마디 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 ‘주민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진부한 말을 하다니 속으로 나도 웃음이 났다. 같이 일하는 들소리 친구들도 내가 던진 이 ‘의외의 말’에 웃음이 났다고 한다. 아무튼 이 뻔한 대사는 그동안 각종 집회에서만 해도 수도 없이 듣던 말이다. 왜 어느 단체의 무슨 무슨 대표가 발언한답시고 앞에 떡하니 나가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던가. ‘대추리 도두리 주민 여러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말들 말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건 대체 뭘까.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무슨 의미로 했던 걸까. 정말 궁금해졌다. 그럼, 내가 말한 ‘마지막’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 난 그 말에 책임을 질 수나 있을까? 아직까지도 난 모르겠다.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책임’ 이것이 내가 몇 달 동안 이 곳에 있게 한 단어 중 하나이다. ‘책임’하니, 왠지 진부한 글이 되어버릴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진부하게도 난 그런 이유로 이곳에 있게 되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찍었던 영상들, 내가 했던 일들에 책임을 지기 위해 난 아직까지 이곳에 있는 것 같다. 늘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싶었지만 나는 그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도망가려야 도망갈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생활의 끝없는 반복, 반복으로 우리는 그렇게 9개월을 보내왔다.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얼추 끝에 가까이 온 것 같다. 요즘 제일 자주 듣는 질문은 “들소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에요?”라는 질문이다. 마을 주민들도 지킴이들도 이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주와 맞추어 우리도 이제 마을을 떠난다. 그 후에는 아마 서울에서 조금 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들소리 네 여자들은 지금도 별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냥 지금을 살 뿐이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은 우선 패스하기로 한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곳에서의 삶이 참 괜찮았다고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이 공간, 이 곳 대추리의 사람들과 그들의 소박한 희망을 생각한다. 그렇게 많은 폭력 속에 내던져진 채로도 우리는 함께였기에 행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함께’라는 것이 주는 느낌 때문에 쉽게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할 것이다. 그래, 우선은 그거면 된 것이다. 마지막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시작인 것이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 참고 - ‘들소리, 함께 살기, 함께 하기’ : [진보적미디어운동연구저널 ACT!] 제36호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 o=1789&subTitle=%BB%E7%C8%B8%BF%EE%B5%BF%B0%FA%B9%CC%B5%F0%BE %EE&keyno=1790 - ‘황새울 방송국 들소리 이야기’ : <미디어로 여는 세상 / 미디어, 우리> 제23회 http://rtv.or.kr/CR08C/23 - 들소리 방송 다시 듣기 http://www.newscham.net/news/list.php?board=deulsori |
||||
'이전호(78호 이전) 아카이브 > 이슈와 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CT! 40호 이슈] 열린채널 6년, 열고 닫음의 문제가 아닌 확대의 계기로 가야 한다. - KBS의 역할을 중심으로 - (0) | 2016.08.12 |
|---|---|
| [ACT! 40호 이슈] 문화다양성협약, 대안세계화 문화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0) | 2016.08.12 |
| [ACT! 40호 현장] 카메라를 통해서 느끼는 자유 : 이주여성들이 들려주는 영상이야기 (0) | 2016.08.12 |
| [ACT! 40호 현장] 영상문화공작소 ‘지따’를 짓고 짖다. (0) | 2016.08.12 |
| [ACT! 42호 이슈] 독점을 깨는 수많은 대안들: 리눅스 설치 축제에 부쳐 (0) | 2016.08.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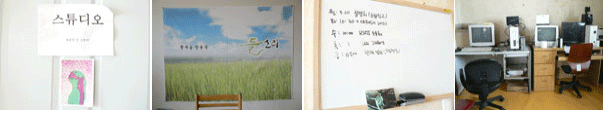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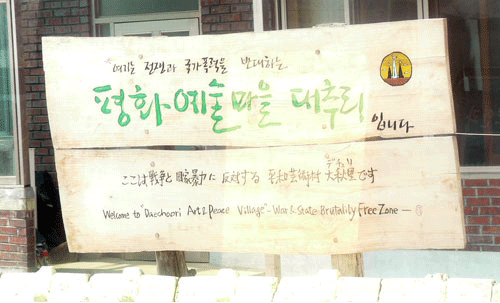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