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CT! 99호 Me,Dear 2016.7.20]
언니가 돌아왔다
김수지(미디액트 창작지원실)
[편집자 주] ‘Me,Dear’은 편집위원들이 일상에서 느낀 소소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단상,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풀고 싶은 고민 등 주제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Me,Dear'를 통해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소박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가 돌아왔다. 승자 언니가.
시인 최승자는 내가 태어난 해, 달에 첫 시집을 냈다. 엄밀히는 어머니뻘 연배인 시인이지만 언니란 호칭을 쉽게 포기할 순 없다. 한동안 승자 언니의 시는 기도문이었다. 마음의 통증때문에 밤마다 이름 모르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몇몇 시인들의 시를 보았다. 승자 ‘언니’ 덕분에 덜 아플 수 있었다.
또한, ‘돌아왔다’라는 서술어 이상으로, 그녀의 새 시집 출간을 적절히 표현할 길은 없다. 좋아하는 언니라고 매일 붙들어 놓고 얘길 들을 순 없지 않나.
그토록 기대었던 최승자의 시어들을 한동안은 잊고 살다, 2011년, 몇 년만에 꺼내들었고 시인의 충격적인 근황도 그 즈음에 알게 되었다. 그보다 일 년 전 일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 옆에는 깊고 맑은 눈 때문에 패인 뺨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는, 체중 30킬로그램을 겨우 넘긴다는 시인의 사진이 있었다. 가족이 없고 밥 대신 소주를 먹어왔다고 했다. 고시원과 여관방들을 홀홀단신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환청이 들리고 헛소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었단다.
이연주의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도 최승자의 시만큼 기댈 어깨 역할을 해주었다. ‘진저리치게’ 만든다는 그녀의 시어들이 내게는 되려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절실하고 적실하게 공유되는 감각을 어떤 매체로 드러내 준 이는 없었다. 이연주는 첫 시집을 출간한 이듬해 스스로 불을 내어 죽었다.
육개월간 잠을 자지 못하기도 했다는 최승자 시인은 불면의 밤들을 건너 살아 남아,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도 하고 새 시집도 냈다. 퍽 반가워서 그녀가 정신분열증에 휩싸이기 이전 전조를 포착할 수 있는, 지금은 절판된 일기를 남산도서관에서 찾아 읽었다. 별자리에 빠져드는 무렵 정황을 묘사하는 문구들이 의외로 발랄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미국 아이오와주 작가 캠프에서 다른 시인이 시인의 <밤>이라는 시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밤이 밀려온다’는 구절을 ‘내려온다’는 개념의 영어 단어로 표현한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라는 시의 ‘겨울 동안 너는 다정했었다’라는 구절에서 ‘다정했었다’를 표현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구절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적 표현에 한해서는 형형하게 살아있을 시인의 의식을 가장 강하게 인식했다.
불 속을 걷는듯 형벌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최승자의 새 시들은 극히 관조적이면서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이었고, 그래서 얼마나 더 괜찮으실까 싶었는데 다시 5년만에 새 시집을 내었다.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은 시로 파국의 국면을 적실하게 노출하기 보다는, ‘내가 스스로 창을 내겠소’....라고 선언하는 듯한, 시어로 숨구멍을 알아서 만들어내는 젊은 시인들의 시를 더 자주 읽는다. 그렇다고 몸에 스며든 어떤 언어와 가장 ‘밀착’되어 있다는 감각을 선사해준 불우한 언니들의 시어들에 대한 사랑이 퇴색할리 없다는 걸, 최승자 시인의 새 시집 출간이 상기시켜주었다.
그 시집을 사러가는 날 이 글을 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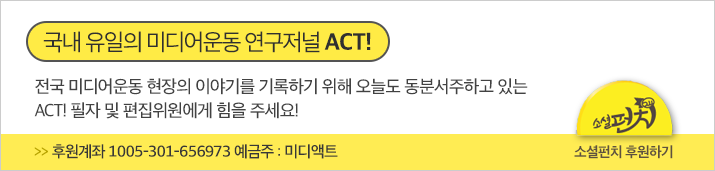
'전체 기사보기 > Me,De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CT! 103호 Me, dear] 김지영이 김지영에게 (0) | 2017.05.15 |
|---|---|
| [ACT! 102호 Me,Dear] 그럼에도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0) | 2017.03.09 |
| [ACT! 98호 Me,Dear] 글에 대한 어떤 두려움 (0) | 2016.05.12 |
| [ACT! 97호 Me,Dear] 활착 (1) | 2016.02.24 |
| [ACT! 95호 Me,Dear] No paradise(, keep the parade) (0) | 2015.10.27 |




댓글 영역